 자연에서 놀며 자라며 배우며한 사람의 기운이나 기분이 그 공간의 명도와 채도를 곧바로 높일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벚꽃보다 주목을 덜 받는 늦봄의 흰 꽃들처럼,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초여름의 오후 햇살처럼 고요하게 눈부신 그의 미소 덕분이다. 억지로 만든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그러한’ 그의 웃음이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문득 빛나게 한다. 타고난 품성이나 갈고닦은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오늘 그의 ‘밝음’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며칠 후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독일에 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혀 2년 반 만에 가능해진 일이다. 그의 설렘과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덩달아 마음이 들뜬다.
자연에서 놀며 자라며 배우며한 사람의 기운이나 기분이 그 공간의 명도와 채도를 곧바로 높일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벚꽃보다 주목을 덜 받는 늦봄의 흰 꽃들처럼,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초여름의 오후 햇살처럼 고요하게 눈부신 그의 미소 덕분이다. 억지로 만든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그러한’ 그의 웃음이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문득 빛나게 한다. 타고난 품성이나 갈고닦은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오늘 그의 ‘밝음’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며칠 후면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독일에 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혀 2년 반 만에 가능해진 일이다. 그의 설렘과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덩달아 마음이 들뜬다.
“제 고향인 랑엔펠트시는 뒤셀도르프와 쾰른 사이에 있는 소도시예요. 말이 소도시지, 들판과 숲이 집 바로 뒤에 있는 정겨운 시골이죠. 어린 날엔 온통 자연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농장이 딸린 집 2층에 세를 들어 어머니와 살았는데 1층에 살던 집주인이 자주 집을 비우셨거든요. 덕분에 농장 전체를 제 것처럼 누릴 수 있었어요. 농장 인근의 숲이며 강이며 들판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스카우트 출신인 삼촌이 자연에서 노는 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연과 환경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셨는데, 그때 그 기억들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같이’ 하면 가능해지는 아주 많은 일
그가 말하는 ‘오늘의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자신을 말한다. 2016년 그린피스 환경보호 영상에서 영화 <매트릭스> 속 명장면을 패러디하기도 했다. 그는 매체 인터뷰나 자신의 SNS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의견을 꾸준히 표출해 왔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하는 데 플라스틱 소비량은 매우 높은 한국의 현재에 일침을 가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컵만 준다는 어느 카페의 방침에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지난해 여름엔 서유럽의 기후 재난을 언급하며 개개인의 일상 속 노력이 왜 중요한지 15분짜리 동영상에 담아 SNS에 올렸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독일경제연구소 발표 자료를 인용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고기 소비, 옷 구매 등을 줄였을 때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독일의 1년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육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해요. 아직은 플렉시테리언(유연한 채식주의자)이지만 완벽한 1명의 비건보다 완벽하지 않은 100명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옷도 별로 안 사요. 사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것을 고르고요. 독일에선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인근 나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동네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한대요. 환경을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는 거예요. ‘럭셔리’를 포기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가능해져요.”

그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도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큰일’이라 믿는다. 독일은 에너지 전체 공급량의 44% 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나라다. 그에 반해 한국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망보다 ‘실천’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쓰지 않는 전기부터 당장 꺼 보자는 것이다. 혼자 줄이거나 아끼면 달라지지 않지만, ‘모두’ 같이 해 나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온 국민의 피땀으로 민주화를 이뤘던 한국에서, 온 국민의 노력으로 기후 위기를 헤쳐 가기를 그는 진심으로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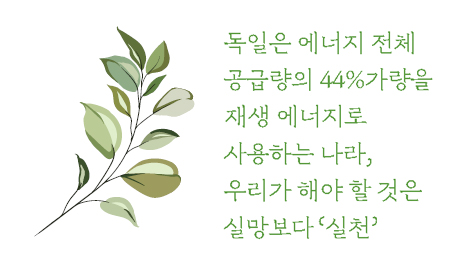
그 자체로 ‘자연’인 한국의 전통문화
그가 한국에 온 것은 2008년의 일이다. 독일 본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다 고려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오면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이 나라에서 오래 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다. 이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과 한국학을 공부했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첫 느낌 그대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기온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한국의 아름다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09년 늦봄, 어머니와 함께 봤던 창덕궁을 잊지 못해요. 연둣빛에서 초록빛으로 바뀌던 후원의 나뭇잎들이며 처마 위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한옥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통문화는 그 자체로 ‘자연’이에요. 흙과 나무와 돌로 지었기에 혹여 무너져도 고스란히 자연으로 돌아가죠. 이토록 친환경적인 한국의 문화유산이 기후 위기로 파괴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2017년 7월 방송된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다니엘 린데만 편’에는 한여름 뙤약볕에도 그와 친구들이 북한산을 오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날 그 산꼭대기에서 고향 친구들과 함께 바라본 서울의 풍경도 그는 잊지 못한다. 평소에도 산을 좋아하던 그가 한국의 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 계기다.
“한국에는 석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절마다 꽃과 잎의 빛깔이 달라서 매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독일은 산까지 가는 길이 꽤 먼데, 한국은 전국 어디든 가까이에 산이 있어 참 좋아요.”
산에 관한 추억은 그밖에도 많다. 열네 살의 어느 해 질 녘 독일 알프스의 산속 호수에서 수영하던 날이 종종 떠오른다. 자연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날 톡톡히 깨달았다. 사춘기에 채워진 ‘자연 감수성’이 오늘도 그를 이끌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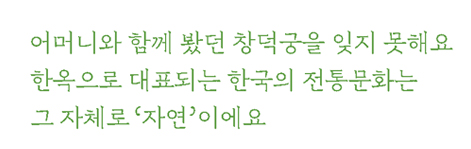 세계 평화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도 포함된다<비정상회담>으로 얼굴을 알린 이래 그가 출연해 온 프로그램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역사저널 그날>, <대화의 희열>, <선을 넘는 녀석들>, 현재 출연 중인 <톡파원 25시>까지 ‘여기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연해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 것. 그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 그는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피아노연주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새 디지털 싱글 <And She said Excuse Me>를 발매하여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쁨을 또 한 번 맛보고 있다.
세계 평화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도 포함된다<비정상회담>으로 얼굴을 알린 이래 그가 출연해 온 프로그램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역사저널 그날>, <대화의 희열>, <선을 넘는 녀석들>, 현재 출연 중인 <톡파원 25시>까지 ‘여기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연해 모두 다 같이 성장하는 것. 그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 그는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피아노연주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새 디지털 싱글 <And She said Excuse Me>를 발매하여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기쁨을 또 한 번 맛보고 있다.
“세계 평화라는 말을 종종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까지 생각해야 진정한 세계 평화가 아닐까 싶어요.”
요새 자꾸 꽃을 찍어 SNS에 올린다고, 자신도 이제 영락없는 ‘아저씨’라고 그가 너스레를 떤다. 유머는 일종의 ‘태도’다. 한때 ‘재미없는 캐릭터’로 통했던 그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분위기가 유쾌해지는지 잘 안다. 한 자리에 나무처럼 서서 그 순간 그곳을 유심히 지켜봐 온 까닭이다. 나무 같은 그가 햇살처럼 웃는다. 숲속처럼 그윽한 향기가 난다.

 올곧게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올곧게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